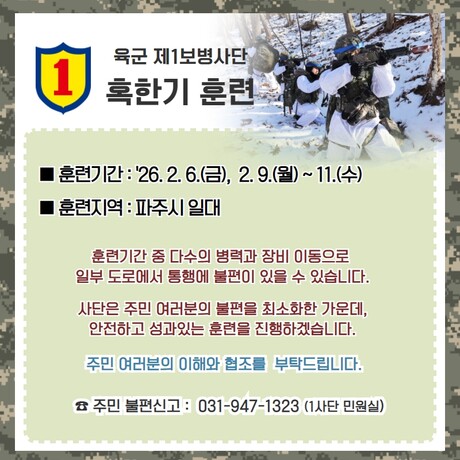[시사투데이인 장수진 기자]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나 의기 투합해 결성
신림동의 조그만 빌딩 지하 로니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강렬하고 힘찬 비트의 음악이 먼저 들려온다. 서로의 음악적 열정과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케어 밴드(care band)로 이름을 지었다는 직장인 밴드를 만났다. 3년 전,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의기투합해 ‘care band’를 결성한 이들은 멤버 모두 학창시절 school band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슴 한 켠에 묻어두고 직장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며 지내다 가슴에 묻어 두었던 열정을 끄집어내 일을 저질렀다. 멤버 구성원의 평균나이는 40세. 그렇지만 이들의 열정과 힘은 20대 청년 못지않다. 오히려 학창시절의 뜨거움과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노련함이 연주에 고스란히 묻어 나온다. 겉멋 쫙 빼고 순수하게 음악이 좋아 즐기며 연주하는 이들에게 음악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팀의 리더 기타리스트 김봉옥씨는 고교시절 밴드동아리에서 기타를 배웠다. Rush의 Tom Sawyer, Black sabbath의 Heaven&Hell, Judas Priest의 Exiter, Led Zeppline의 Stairway to heaven, Pink Floyd의 Shine on you craze diamond 등 당시 동경의 대상이었던 곡들을 80년대에는 장비가 없어 제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요즘 삶이 새롭게 다가오는 건 그런 곡들을 직접 연주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곡을 연습하고 멤버들과 합주하면서 곡의 짜임새에 놀라고 그들의 실력에 다시 한 번 감탄한다. 그리고 느낀다. 그들이 연주하면서 느꼈을 법한 쾌감을...
프로뮤지션이 되고 싶었던 드러머 이준홍씨는 음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뮤지션이 되는 걸 포기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음악을 완전히 접을 수는 없었다. 연주도 모범생처럼 하는 드러머. 그의 가방엔 드럼 스틱이 꽂혀져 있다. 집에서는 쿠션을 올려놓고 연습을 한다. 드럼을 연주할 때 그는 행복하다.
중학교때 통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을 시작한 베이시스트 임창완씨. 그는 오랜 직장생활을 접고 음악을 다시 시작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임창완씨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다. 가족도 그의 결단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2년을 살았다. 그러나 그 생활은 계속되지 않았다. 힘들게 버텨오다 다시 취직을 했다. 그래도 음악은 계속하고 있다. 방법을 바꿨을 뿐이다. ‘care band’는 그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통로이다.
최근 팀에 합류한 키보드 장세은씨는 다른 밴드에서 활동을 계속 해왔다.
그러다 ‘care band’를 알게 되었다. 대부분 밴드가 겉멋 들어 음악을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겸손했고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했다. 취향과 음악에 대한 기호가 맞아서 합류했다. 장세은씨는 돈을 모아 꼭 갖고 싶었던 키보드를 한 대 장만할 예정이다.
아직은 연습이 부족해 멤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조심스럽다. 그러나 곧 멤버들과 근사한 연주를 해낼 것이다.
멤버 중 가장 막내인 보컬 정재윤씨는 그저 음악이 좋고 형들이 좋다. 그래서 잡다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연습은 출, 퇴근 시 차안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틈만 나면 한다. 그에게 노래는 생활의 활력소이다. 그 외 ‘care band’의 중심에 최고참 용준(기타리스트)씨가 있다. 이날 그는 출장을 가서 연습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것이 직장인밴드의 애로사항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밴드가 오래 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부모에게는 자식의 역할을 또 해야 하니까. 그래도 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이다.
‘care band’는 로니 스튜디오에서 매주 수요일 밤 8시부터 2시간 정도 연습 한다. 보통 한곡을 마스터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정기적으로 년 1회 단독공연을 하고 수시로 클럽에서 활동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공연을 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이들은 80년대 그들이 선망하고 동경했던 대곡들을 copy하고 때론 자기들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연주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남들이 어려워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곡에 도전하고 연습을 거듭해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만족을 얻는다. 완벽한 합주가 이뤄졌을 때 서로를 향해 박수를 친다.
봄이 오면 클럽에서 공연도 가질 예정이다. 
이들에게도 고정 팬이 있다.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 완성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care band’의 연습은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된다.
장수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