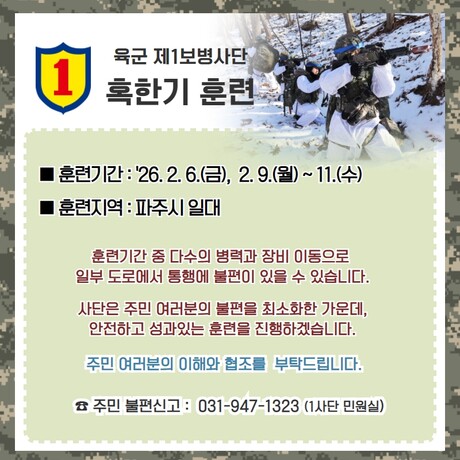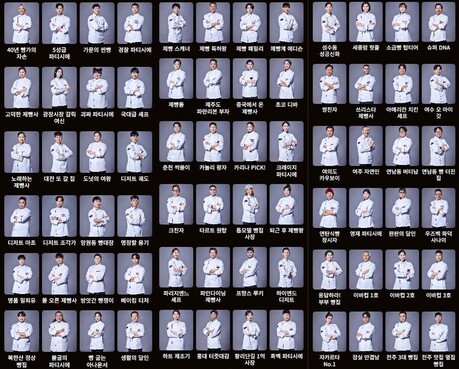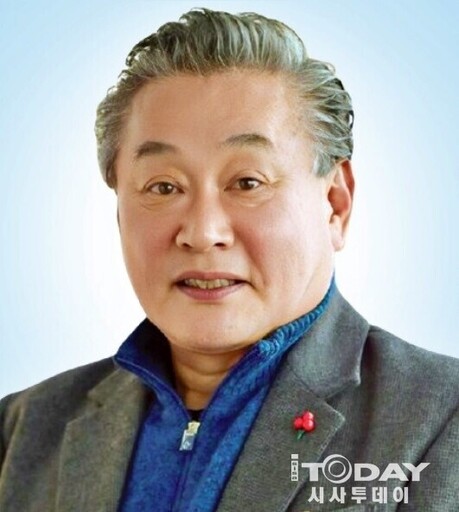[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 달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1일 발표했다.
우선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어선에서 분리 사용돼 해상투기가 쉽고 유실률이 높은 어구부터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친환경부표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차단하고 국제기구와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바다환경지킴이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안가에 상시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해 수거뿐만 아니라 투기 예방, 계도 등 예방 활동도 수행한다.
또한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해안가 미세플라스틱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을 개발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해 항만과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유입도 차단한다.
해양오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파악해 오염원 판별 기법, 유해물질 유입량 산정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산 온산항 등 37개 오염우심해역에 대한 정화·복원 사업을 지속하고 추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해역을 조사·발굴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