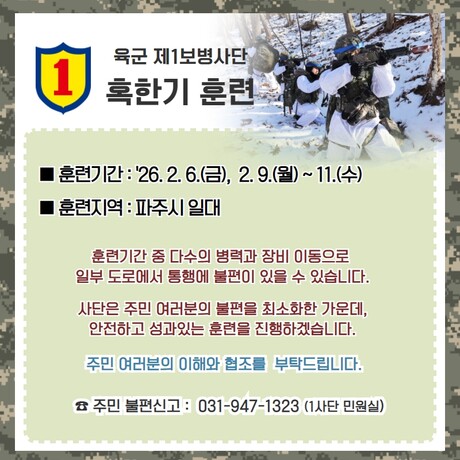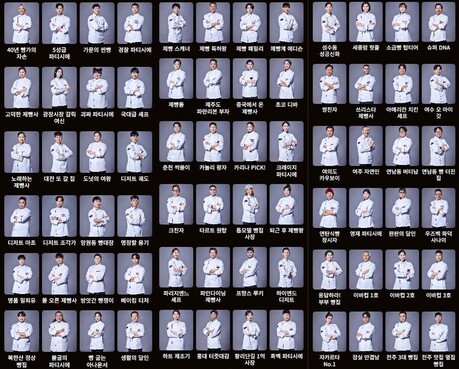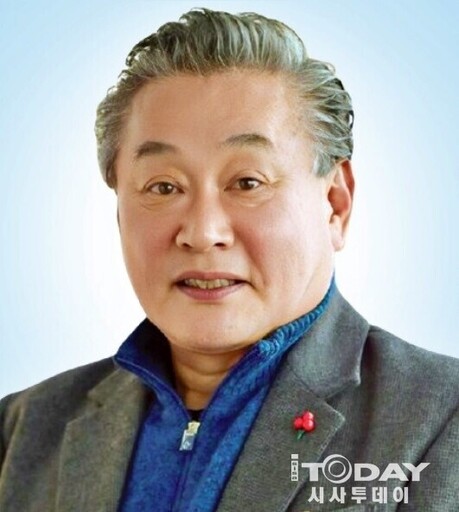우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에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는 달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황은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말이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사소한 말 한 마디가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부주의한 말 한 마디가 관계를 어렵게 했던 경험을 한두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똑바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해 없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면 무얼까?” 하고 궁금해하시겠지만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과 같이 것들이 바로 일정한 기준입니다. 흔히 어문 규범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러한 규범은 운전을 할 때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교통 신호가 원활한 운전을 도와주듯이 규범은 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말하는 국어를 한글로 적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생각해 보세요. ‘꽃이, 꽃도, 꽃만’을 한번 읽어 볼까요?
‘꽃이’는 [꼬치], ‘꽃도’는 [꼳또], ‘꽃만’은 [꼰만]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이들이 모두 ‘꽃’을 가리키는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꼬치,꼳또,꼰만
꽃이, 꽃도, 꽃만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꽃’ 하나로 형태를 고정해서 ‘꽃이, 꽃도, 꽃만’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꽃이, 꽃도, 꽃만’으로 적어도 소리는 [꼬치], [꼳또], [꼰만]이라고 나겠지요. 얼굴이 셋인 사람과 얼굴이 하나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얼굴을 기억하는 것보다 한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쉽겠지요?
‘표준어’는 여러 지역의 말 중에서 한 지역의 말을 대표로 정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지역에 따라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지역의 말을 표준어로 정했지요. 그렇다고 서울 지역의 말이 다른 지역의 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 지역의 말을 표준어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어를 쓰는 것은 출신 지역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통하고 ‘말’이 되는 세상,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노현정(KBS 아나운서, 국어원 홍보대사)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