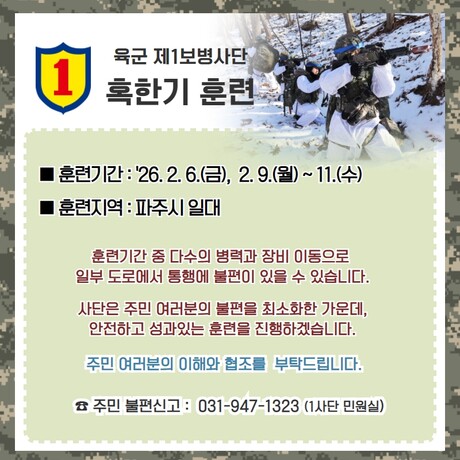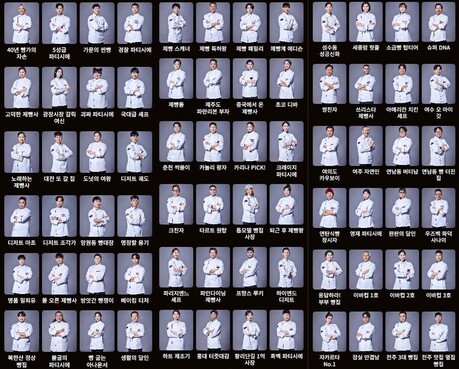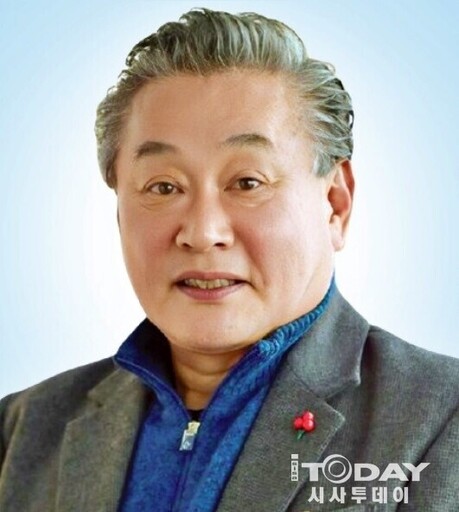[시사투데이 장수진기자]“관찰하다보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는 배려로 이어져”
긴 겨울을 빠져나오는 길목 3월의 극장가는 비수기라고 할 수 있다. 어두컴컴한 극장보다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볕을 쬐며 공원을 산책하고 창이 넓은 카페에 앉아 마시는 쌉싸름한 커피 한잔이 더 당기는가 보다. 그래서인지 개봉하는 영화마다 흥행 성적이 그닥 좋지 않다. 무엇보다 3월의 극장가는 외화에 밀려 한국영화가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독립영화의 선전이다. 자본력과 스타배우를 내세우지 않고도 탄탄한 시나리오와 주제의식이 확실한 영화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 말이다.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상영을 계속하고 있는 ‘혜화, 동’과 ‘파수꾼’은 평단의 호평과 함께 관객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두 영화의 입소문을 이어갈 독립영화 한 편이 개봉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바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기를 다룬 박정범감독의 ‘무산일기’다.
영화 ‘무산일기’를 연출하고 직접 주연을 맡은 박정범감독은 ‘누군가의 일상을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고 연출의 변을 전했다.
이 영화는 실제 탈북자였던 박정범감독의 친구 전승철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다. 학교 후배로 들어온 전승철과 가까워지면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박정범감독은 생각지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나 후배 승철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에게 과연 이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차별과 멸시를 받는 수많은 탈북자를 위해 꼭 해야만 했던 이야기였다.
영화 ‘무산일기’는 살아남기 위해 친구를 죽이고 ‘무산’(함경북도)을 떠나 남한행을 선택한 승철이 치열한 경쟁의 도시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한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사실적이면서 섬세하게 그려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로 시작되는 탈북자들.
승철은 탈북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일을 얻기도 쉽지 않다. 겨우 전단지나 현수막을 부착하는 일로 생활비를 벌지만 그마저도 다른 경쟁자에 의해 그들의 영역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뜯겨지고 쫓기고 얻어터지기까지 한다. 그런 회색빛만이 감도는 서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일요일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숙영을 보는 것이다.
어느 날 승철은 숙영이 노래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알바로 들어간다. 하지만 숙영은 승철에서 교회에서 모르는 척 해달라고 매몰차게 말한다. 한편 승철의 유일한 친구인 경철은 탈북자 브로커 일이 잘못 돼 도망자 신세가 되고 승철에게 자신의 전부가 달린 돈뭉치를 부탁한다. 그러나 승철은 경철을 배신하고 얻은 돈으로 머리를 자르고 양복을 사 입는다. 그렇게 승철은 자신이 지켜왔던 순수함을 버리고 이제 숙영과 친구 경철처럼 남한 사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해가려 한다.
영화 ‘무산일기’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탈북자 이야기를 넘어 이 땅에서 소외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동안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니 잔상이 남는 건 왜일까.
영화는 4월 14일 개봉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