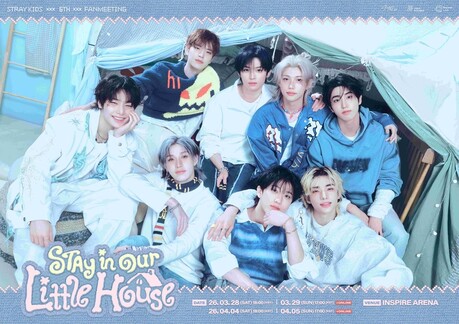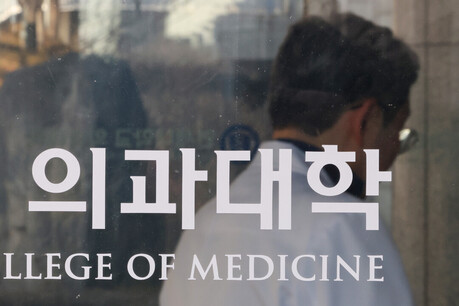-지난 해 7월 대학로 곤이랑 아트홀 -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음학 비결 공개
그는 역시 프로였다.
웃음학 강의 ‘엔돌핀 코드’는 무대에 달랑 칠판하나가 전부인 스탠딩 개그로 코미디언 김형곤(44)의 내공이 느껴지는 공연이다. 2시간 동안 그 특유의 풍자성 강한 유머로 관객을 끊일 새 없이 웃게 만드는 그는 역시 무대가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19세 이하 관람금지 성인 코미디답게 성담론이 심심찮게 등장하지만 “2시간동안 100번 웃겨주겠다”는 그의 호언장담이 무색치 않은 만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실컷 웃을 수 있는 웃음의 무대였다.
지난 89년, 극단 ‘곤이랑’을 창단한 후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과 성인코미디로 꾸준히 웃음을 선사해온 그에게 제4탄 ‘엔돌핀 코드’는 2002년 자신의 결혼생활을 소재로 삼았던 ‘아담과 이브’에 이어 3년 만에 선보인 폭소 강의의 결정체다.
그는 ‘웃음은 곧 경쟁력이다’란 타이틀을 내걸었다. “우리가 2만불 시대를 만들려면 모든 회의와 모임의 시작은 CEO의 유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웃음의 철학을 강의하는 김씨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연설문을 준비할 때 유머를 준비하는 담당관이 따로 있을 만큼 웃음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라며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웃음학 비결을 공개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하니까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지요. 미국은 911테러 후 사회전반에 퍼져있던 두려움을 웃음으로 극복한 나라입니다. 그 예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는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청바지를 입었고 안내방송은 랩으로 하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또 담배피울 사람은 베란다로 나가 피우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곳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란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재치 있는 한마디로 마무리했지요. 얼마나 기발한 발상입니까? 덕분에 그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은 실컷 웃을 수 있었고 항공업계가 불황일 때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국기 하강식 때처럼 하루에 한번, 온 국민이 맘껏 아무 이유 없이 1분 동안 웃는 제도가 신설되어 한다며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형곤씨. 그는 “이번 공연은 웃음의 비밀을 풀어가는 행복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국 大에서 국어교육학과를 전공, 지난 80년 T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한 그는 ‘공자 가라사대’,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등에서 정치, 시사적인 풍자 코미디로 시청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왔다. 그 후 89년에 극단 ‘곤이랑’을 창단, 방송활동보다는 소극장 무대에서의 활동에 전념해 온 김씨는 현재는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이사로 활동 중으로 이 공연의 수익금의 일부는 소아암협회에 기부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수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소아암 병동에 가면 6-7살된 어린이들이 저를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러온 그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오지요.”
얼마 전 모 여배우가 우울증으로 죽음을 선택, 심각한 사회병리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 큰 슬픔을 느낀다는 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로 1년에 35만명, 하루에 38명이 죽어가고 있다.”며 “사람 간에 웃음이 사라지고 대화가 끊길 때 사회적인 우울증은 더욱 깊어진다.”고 진단, 한때 자신도 자살을 결심한 적이 있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아병동의 어린 눈망울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며“아무리 불행해도 그곳에 가보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객들에게 5분마다 웃을 때 엔돌핀이 생성, 하루에 15번은 꼭 웃으며 살기를 당부하는 김형곤씨는 “장기입원환자나 각 기업체 등 자신의 웃음학 강의를 듣겠다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온 국민의 엔돌핀 전도사로 불리길 희망했다.
또 얼마 전 모 여배우가 우울증으로 죽음을 선택, 심각한 사회병리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 큰 슬픔을 느낀다는 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로 1년에 35만명, 하루에 38명이 죽어가고 있다”며 “사람 간에 웃음이 사라지고 대화가 끊길 때 사회적인 우울증은 더욱 깊어진다”고 진단, 한때 “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아병동의 어린 눈망울들을 보고용기를 얻었다”며 “아무리 불행해도 그곳에 가보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살아서는 국민에게 웃음을, 죽어서도 사회에 시신을 기부하여 타의 본이되는 삶의 길을 선택했다.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하늘높이 치솟는 욕망을 어쩔줄 모르는 인생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이제는 그의 나마지 잠자리가 편안했으면 싶다.
백인숙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